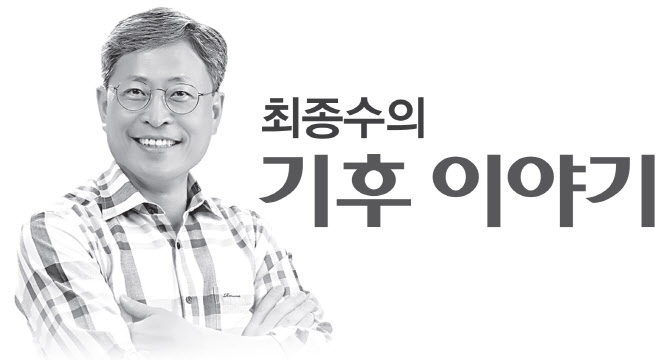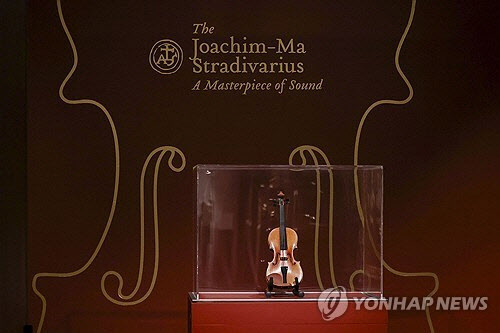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요아힘 마’(사진=연합뉴스)
과학자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자연이 남긴 흔적에서 찾는다. 대표적인 예가 나무의 나이테다. 나무는 기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이 변화는 나이테에 기록된다. 나이테를 분석하면 수천 년 전까지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 수만 년 전의 기후 정보는 동굴의 종유석, 바닷속 퇴적물, 극지방의 빙하 속 공기방울 등 다양한 자연 기록을 통해 복원된다.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면 지구는 수십만 년 동안 따뜻해졌다가 추워지는 온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온난화도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일까. 실제로 지구는 수십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주기를 보여 왔으며 이는 지구 궤도와 자전축 변화 등 이른바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온난화는 이런 자연 주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혁명 이후 불과 150여 년 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서 430ppm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구 평균기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후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변화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과거 어느 시기에도 없던 빠르고 극단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주기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인위적 변화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과거의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17세기 소빙하기의 유럽과 조선 사례처럼 기온 변화는 곡물 수확량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사회 구조와 정치 질서까지 뒤흔들었다. 조선의 경신대기근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불러온 국가적 위기의 전형이었다. 이 사례는 기후가 인간의 생존 조건을 좌우하며 나아가 한 사회의 존속 여부까지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기후는 단지 ‘날씨’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본질적인 힘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이후의 온난화는 폭염과 해수면 상승, 에너지 수급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과거 사회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너졌듯이 오늘날 문명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과학과 기록이 있고 아직 대응할 시간도 남아 있다. 자연이 남긴 기후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