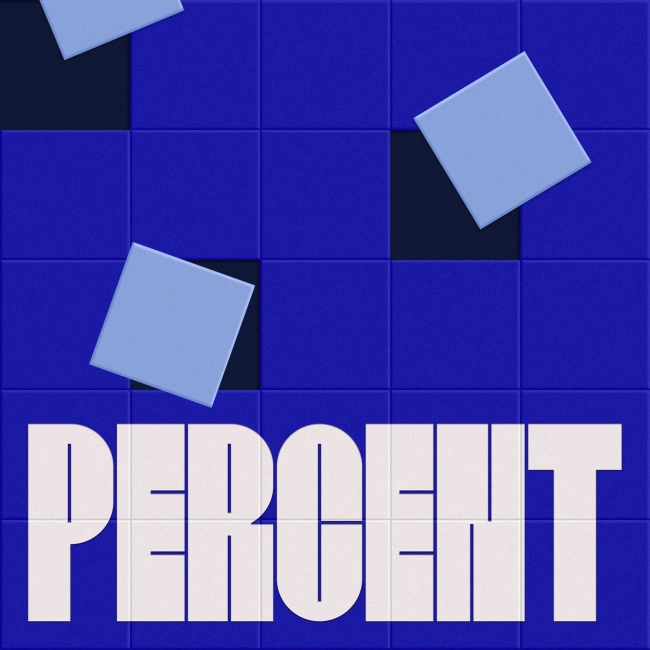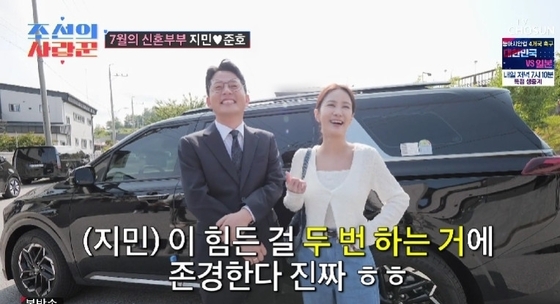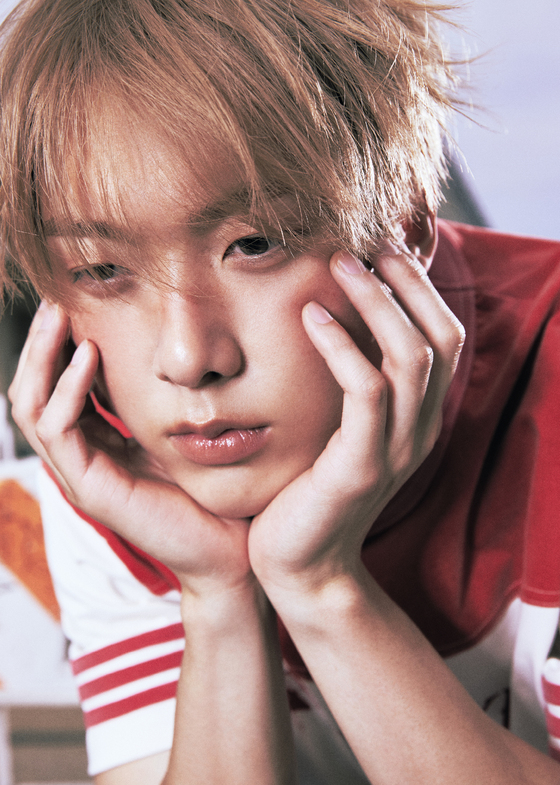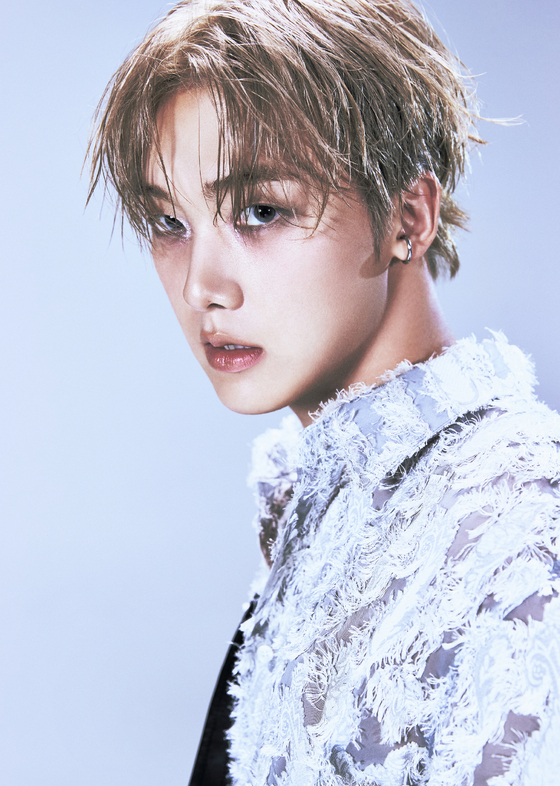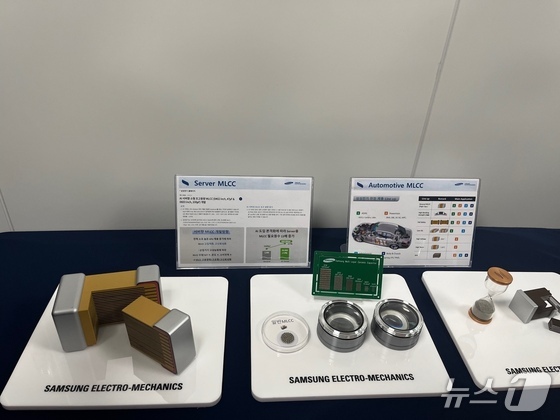하지만 자칫 길을 잘못 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십상이다. 이전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 경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만난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법률가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지 싶다. 당시 만남은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어서 과거 자료를 뒤적여 찾아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5년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로 한참 소득주도성장론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띄울 때였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기업 양극화가 심하고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성립할 수 없는 모델이었다. 만난 김에 한국의 현실에 소득주도성장론은 맞지 않으며 자칫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된 후 소득주도성장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문재인 정부 실패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유력한 대선주자 시절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필자가 쓴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책을 읽어 보고 연락을 해왔단다. 책에서 강조한 대로 “진보나 보수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의 실제 행보는 그러지 못했다. 극우 보수의 투사와도 같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된 도그마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도그마는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럴 여력이 없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의 복지체계만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국가부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앞을 먼저 거쳐 간 일본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의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데 급급한 포퓰리즘과 다름 없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노동을 유의미하게 대체하는 미래의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AI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충분히 해낸다는 전제하에 일자리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기본소득 제도는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의 재원은 AI 로봇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 정책의 맨 앞에 AI 강국이 놓인 것은 미래 기본소득 도입의 초석으로서 대단히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도그마의 유혹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조급히 기본소득을 뿌리내리려는 유혹의 손길을 어떻게 뿌리치는가가 이 대통령 성공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의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의 사례를 곱씹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