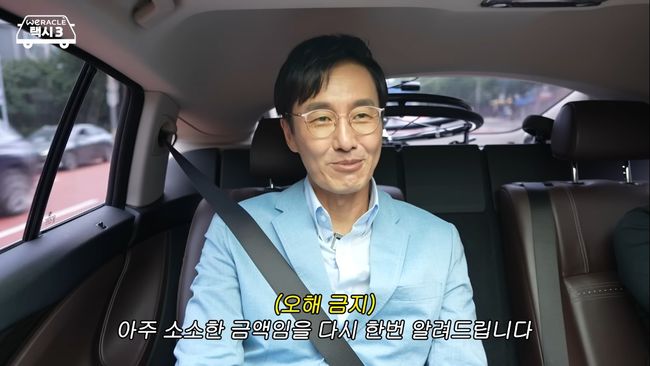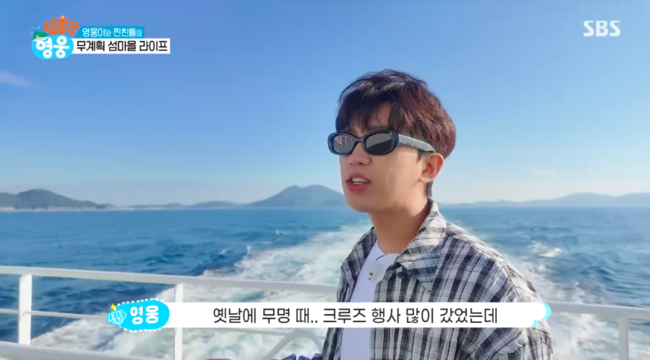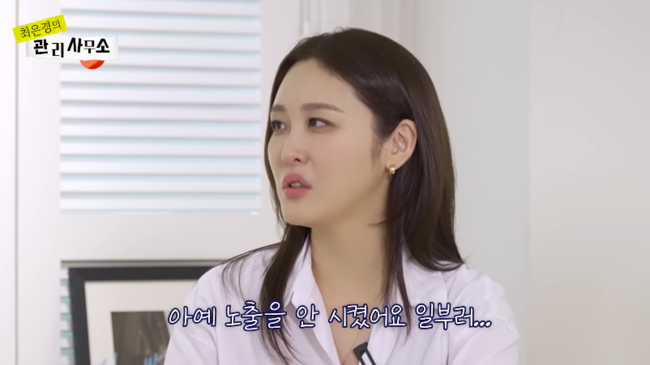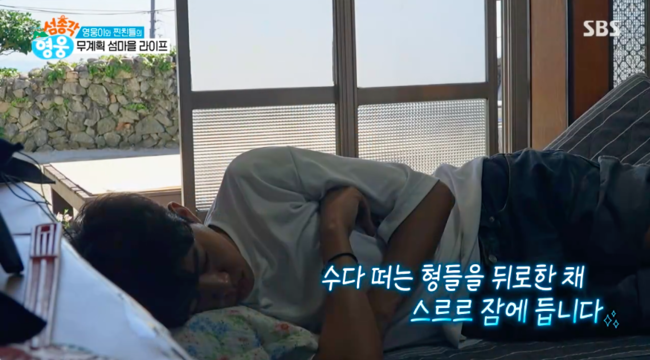(MHN 이주환 기자) F1의 설계 철학은 단순하다, 필요한 것은 빠름뿐이다.
지난 6월 25일 개봉한 영화 ‘F1 더 무비’ 흥행으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레이싱 장면 속 선수들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땀에 흠뻑 젖는다.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한 F1 최다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40)은 한 토크쇼에서 “(차 무게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F1 경주차에는 에어컨이 없다”며 “내가 1kg 더 나가면 레이스 동안 2초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어컨이 없어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1시간 45분 동안의 레이스에서 운전자 체중이 한 번에 4kg나 빠진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무게’와 ‘출력’이다. F1은 1kg의 차이가 기록을 좌우한다.
에어컨을 달면 압축기·냉매·배관·송풍팬 등으로 차량 무게가 최소 20kg 늘어난다. 이 추가 질량은 가속과 제동, 코너링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 초경량화를 위해 차체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탄소섬유로 무게를 다이어트하는 F1에서는 성능 이득이 없는 장비를 실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에어컨은 엔진(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출력을 일부 소모하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를 모두 속도와 공력 성능에 투입해야 하는 F1에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구조적 이유도 뚜렷하다. F1은 오픈 휠·오픈 콕핏 특성상 실내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다. 냉기를 ‘가둘 공간’이 부재한 데다, 초고속 주행 중에는 냉방 효율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F1은 차에 에어컨을 얹는 대신, 브레이크‧엔진‧전자장비를 위한 공력 냉각 설계를 최적화하고, 드라이버에게는 착용 장비 중심의 대체 쿨링을 적용한다.
쿨링 베스트, 냉각수 주머니(드링크 시스템), 헬멧 내부 공기 순환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견뎌야 하는 환경은 혹독하다. 국내 내구 레이스에서도 콕핏 온도는 쉽게 5~60℃를 넘나든다. 아주자동차대 박상현 교수는 “F1이 아니라 국내 내구 레이스 같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도 (운전 후) 2~3kg씩 빠진다”며 “차 내부 열이 엄청 높기 때문에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프로 레이싱 선수로도 활동하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은정 교수는 “시합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대부분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인데 1~2kg 정도는 빠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더위 속 체중 변화가 곧 건강 위험을 뜻하진 않는다. 이은정 교수는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빠진 거라 위험하지는 않다”며 “이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박상현 교수도 “신체적 조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선수들이라 체중 변화에 적응할 것이다”라며 “단기적으로 수분만 빠졌기 때문에 금방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레이싱 훈련은 ‘고온 적응’이 관건이다.
이은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더운 날에도 달리기를 하면서 고온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레이스 중 긴장으로 심박수는 평소 보기 힘든 수준인 170bpm대까지 치솟는다. 결국 F1 드라이버의 퍼포먼스는 차량·장비의 냉각 효율과 함께, 체력·심폐지구력·집중력을 얼마나 고온 환경에 맞춰 단련했는지가 좌우한다.
비용 또한 상징적이다. 팀과 사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개발·설계·제작·부품·테스트까지 모두 합산하면 F1 한 대의 제작비만 한화 27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쾌적함’보다 0.01초를 위한 경량화·출력 확보·공력 최적화가 우선되는 이유다.
에어컨이 없는 세계 최고 성능차라는 역설은, 곧 F1이 왜 ‘달리기만을 위해 태어난 기계’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사진=레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