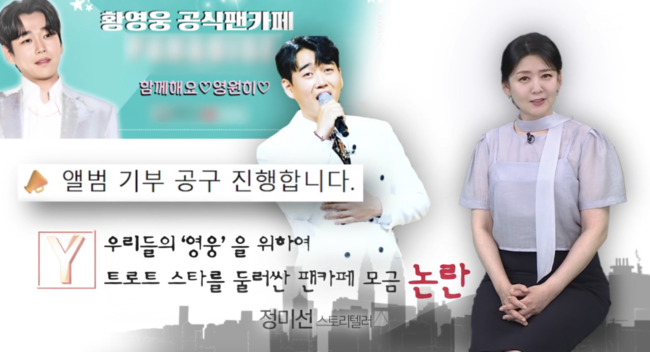[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감정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공공기관과 각종 기업은 AI챗봇을 활용해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접수한다. 하지만 챗봇 하나 만들기 위해 개발자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예상 문의 및 답변 수십 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만 넘기면 하루 만에 의뢰 기업에 특화한 AI챗봇을 만들 수 있다. 챗봇으로 수집하는 자연어를 디지털화해 마케팅 자료로도 제공한다. 바로 AI스타트업 ‘페르소나AI’의 인공지능 콘택트센터(AICC) ‘소나워크’다.

(사진=챗GPT)
AI챗봇 제작 의뢰를 위해 해야 하는 건 오직 수십 개의 예상 질문 및 답변(FAQ)를 만드는 작업뿐이다. 평소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 뿐만 아니라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온갖 창의력을 동원해 작성한다고 해도 질문·답변 세트가 100개를 넘긴 어렵다.
소나워크는 자연어 생성(NLG) 기술을 바탕으로 이 100개도 안 되는 FAQ 데이터를 10만개 이상의 학습데이터로 만든다. 의뢰인이 제공한 FAQ 자료와 해당 기업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외부 정보까지 참고해서 새로운 예상 질문과 답변 세트를 생성하는 원리다. 혼잡한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자연어 형식의 예상 질문·답변 1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다.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찾아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소나워크의 장점이다. 만약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자가 신제품의 성분 표시를 깜박했다면 AI는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성분을 지어내서 말해줄 수 없다.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고 AI챗봇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을 미리 찾아내 의뢰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입력하게 함으로써 AI의 할루시네이션(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인다.
이렇게 완성된 AI챗봇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1차로 10만개 상당의 FAQ에서 관련 답변을 찾는다. 이후 내부 DB, 외부 데이터 순으로 답변에 참고할만한 정보를 찾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고객 감정까지 분석…“창의적 질문도 대응 가능”
챗봇 이용자들의 창의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소나워크는 이마저도 해낸다. ‘복통’ 환자는 복통에 대해 문의하지 않고 ‘배가 꾸루룩거린다’는 식으로 본인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나워크에는 생성형AI 기술이 접목돼 있다.
이 같은 센스는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유 대표는 서비스 개발 초기 병원 AI챗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나워크에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학습시켰다.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병명이 아닌 증상으로 상담을 했다. 결국 질병 이름을 기반으로 질 좋은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질문을 이해하고 관련 변수에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했던 셈이다.
소나워크가 만든 AI챗봇은 채팅 중인 상담자의 감정도 분석한다. 어떤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 때 만족하는지 등을 파악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자료로 참고한다. 또한 채팅 중인 사람의 주 접속 시간, 대화 패턴, 기본 정보 등을 참고해 마케팅 참고 데이터를 만든다. 실시간으로 상담자가 어떤 상품에 관심이 많을지 예상해 추천하기도 한다.
소나워크는 플랫폼별로 AI챗봇을 따로 만드는 수고도 덜어준다. 페르소나AI에 의뢰해 하나의 AI챗봇만 만들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각종 SNS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다. 챗봇 정보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만 수정하고 연동 버튼만 눌러주면 순식간에 모든 챗봇이 수정된다. 이 같은 연동 방식은 플랫폼별로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를 가능성도 제거한다.
소나워크는 현재 페르소나AI 매출의 약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소나워크 수요는 지난해 급증했는데 전통적인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려는 수요가 높아졌고 그 출발점으로 AI챗봇을 찾는다는 이유에서다. 유 대표는 소나워크 구독모델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AI에이전트도 구독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